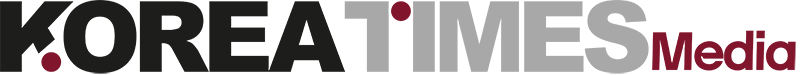국민 모두가 매일 국민의례를 했던 때가 있다. 그 시절 극장에서는 영화가 시작하기 전 “애국가를 상영하니 모두 일어나 달라”는 방송이 나왔다.
친구들과 정신없이 놀다가, 바쁘게 길을 가다가, 동네 어귀 평상에 앉아 있다가도 오후 5시나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애국가에 남녀노소 모두 ‘동작 그만’ 상태가 되어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올려야 했다.
1971년 유신정권부터 시작해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인 1984년 법제화된 국민의례는 독재정권의 철권통치 수단으로 남용되다 민주화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1989년 1월에서야 폐지됐다.
현재 국민의례는 2010년 7월 제정된 ‘국민의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정부행사 등 각종 공식적인 의식이나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제창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격식으로 치러진다.
독재정권이 행한 철권통치를 효율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됐던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국가 예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례를 보는 곱지 않은 시각 또한 존재한다.
국민의례가 지닌 기본정서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사실, 국민의례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궁성요배, 기미가요 제창, 신사참배’를 했던 의식에서 비롯된 일제 강점기의 식민용어이자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국민의례의 긍정적 요소도 분명 존재한다. 파편화된 한 나라의 개인을 국가의 일원으로 결속시키고 국민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선한 의식일 수 있다.
문제는 이민사회 속 국민의례의 지나친 ‘남용’이다. 어쩌면 ‘무분별한 습관적 사용’이 더 적절한 표현일 수 있다.
많은 한인단체들이 거의 모든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실시한다. 3.1절 기념식이나 8.15 광복행사 등 국가행사에서의 국민의례는 당연하다.
행사 도중 애국가를 부르며 가슴이 울컥하는 일도 허다하다. 국민의례를 통해 나라를 떠나온 이민자의 애달픈 마음을 위안받거나 한민족으로서 결속력이 증진되기도 한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단체나 모임의 일반적인 현안을 논의하는 월례회나 비정기 모임, 심지어 먹고 노는 송년잔치에서조차 국민의례를 해야 할 이유는 마땅히 찾기 힘들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은 부조리에 항거해 작은 촛불 하나 들고 광장으로 나오는 시민들의 가슴 속에 담겨 있지, 국가가 정한 의식이나 의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건 대한민국 역사가 이미 증명했다.
더 냉정히 얘기하자면 독재정권의 국민통제 수단으로 사용되던 국민의례가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유산도 아니고 국가적 전통도 아닌 이상, 모든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해야 한다는 강박 자체가 탈피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 아닐까 싶다.
과도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민사회의 국민의례 남용, 깊이 고민해볼 일이다.
최윤주 발행인 choi@koreatimest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