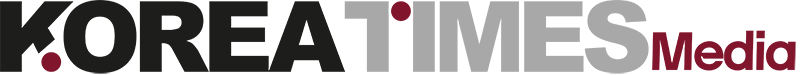17
그리스 시대,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가면’을 썼다.
가면을 쓰는 순간, 배우 자신은 가면 뒤에 철저히 가려졌다.
맡은 배역의 인격만이 무대 위에 존재할 뿐이다.
가면을 쓰는 순간, 배우 자신은 가면 뒤에 철저히 가려졌다.
맡은 배역의 인격만이 무대 위에 존재할 뿐이다.
고대의 연극이 가면을 사용한 이유는 배역의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두 개의 가면을 쓰면 두 개의 인격을 표현해야 했고,
세 개의 가면을 지닌 배우는 세 명의 각기 다른 인격을 나타내야 했다.
한 사람의 배우가 여러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보니
연극 속 다양한 인격을 표현하기에 가면만큼 좋은 도구는 없었다.
두 개의 가면을 쓰면 두 개의 인격을 표현해야 했고,
세 개의 가면을 지닌 배우는 세 명의 각기 다른 인격을 나타내야 했다.
한 사람의 배우가 여러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보니
연극 속 다양한 인격을 표현하기에 가면만큼 좋은 도구는 없었다.
페르소나(persona).
그리스 시대 배우들이 썼던 가면의 이름이다.
심리학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본래의 얼굴을 감추고
다른 얼굴로 관계를 형성하는 걸 뜻한다.
그리스 시대 배우들이 썼던 가면의 이름이다.
심리학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본래의 얼굴을 감추고
다른 얼굴로 관계를 형성하는 걸 뜻한다.
삶이라는 무대 위에 나타나는 다양한 인격이라는 점에서
고대극에서의 ‘페르소나’와 심리학의 ‘페르소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고대의 페르소나는 ‘사회적 역할’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누군가의 아들은 누군가의 아빠이고, 배우자이고,
동료이고, 친구이고, 후배이고, 상사이고, 부하직원이다.
누군가의 아들은 누군가의 아빠이고, 배우자이고,
동료이고, 친구이고, 후배이고, 상사이고, 부하직원이다.
문제는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역할의 페르소나만 존재하진 않는다는데 있다.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진다.
사회가 분화되고 관계가 넓어질수록 페르소나의 숫자도 늘어난다.
연극 무대에서 전혀 다른 사람을 연기하듯,
삶의 무대 곳곳에서 천양지차의 얼굴이 등장한다.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미약한 약자의 가면을 쓰던 사람이
약자 앞에서는 피 한방울 나오지 않을 폭압의 가면을 꺼내들기도 하고,
한없이 신실했던 이가 교회 밖으로만 나오면 딴 사람이 되기도 한다.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진다.
사회가 분화되고 관계가 넓어질수록 페르소나의 숫자도 늘어난다.
연극 무대에서 전혀 다른 사람을 연기하듯,
삶의 무대 곳곳에서 천양지차의 얼굴이 등장한다.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미약한 약자의 가면을 쓰던 사람이
약자 앞에서는 피 한방울 나오지 않을 폭압의 가면을 꺼내들기도 하고,
한없이 신실했던 이가 교회 밖으로만 나오면 딴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페르소나라는 가면은 ‘나’에게 내재된 다양한 욕구의 분출이다.
모범적인 학생, 잘 믿는 성도, 유능한 직장인, 가정적인 아버지, 위압감을 주는 폭군,
무서워 보이는 무법자, 대적할 수 없는 능력자 등의
다양한 가면이 상황과 상대에 따라 마치 ‘나’인양 등장한다.
무서워 보이는 무법자, 대적할 수 없는 능력자 등의
다양한 가면이 상황과 상대에 따라 마치 ‘나’인양 등장한다.
고대 연극무대 위 페르소나는 근대로 들어서면서 분장으로 진화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무대 밖 관객들에게
연기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과장된 분장은 필수였다.
멀리 떨어져 있는 무대 밖 관객들에게
연기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과장된 분장은 필수였다.
심리학의 페르소나도 마찬가지다.
가면을 자주 쓰다보면 어느새 가면이 얼굴에 꼭 맞는 분장이 되어
내 얼굴인양 착각하게 된다.
‘개인’(person)이라는 말과 인격(personality)’이라는 단어가
‘페르소나’(persona)에서 유래한 것도 우연은 아니다.
가면을 자주 쓰다보면 어느새 가면이 얼굴에 꼭 맞는 분장이 되어
내 얼굴인양 착각하게 된다.
‘개인’(person)이라는 말과 인격(personality)’이라는 단어가
‘페르소나’(persona)에서 유래한 것도 우연은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민낯을 보여줄 수 없는 건 현대사회에 들어서 초절정을 이룬다.
가면과 분장도 모자라, 턱을 깎고 눈을 찢고 코를 높여
‘가면’을 아예 얼굴에 장착시켜버린다.
개인이 가진 본래의 성격은
말쑥한 옷차림과 빛나는 졸업장과 두둑한 지갑 뒤에 깊숙이 감추어진다.
현대의 페르소나다.
가면과 분장도 모자라, 턱을 깎고 눈을 찢고 코를 높여
‘가면’을 아예 얼굴에 장착시켜버린다.
개인이 가진 본래의 성격은
말쑥한 옷차림과 빛나는 졸업장과 두둑한 지갑 뒤에 깊숙이 감추어진다.
현대의 페르소나다.
가면(persona) 자체가 인격(person)일 순 없다.
가면의 모습에 빠져 자신의 민낯이 무엇인지 판단 조차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페르소나를 찢어버리고 민낯을 드러내는 아픔을 견뎌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가면의 모습에 빠져 자신의 민낯이 무엇인지 판단 조차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페르소나를 찢어버리고 민낯을 드러내는 아픔을 견뎌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가면이 가득한 세상, 민낯의 사람내음이 그립다.
[코리아타임즈미디어] 최윤주 편집국장 choi@koreatimest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