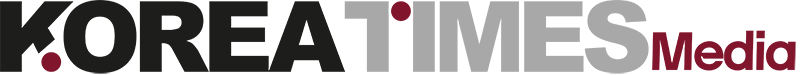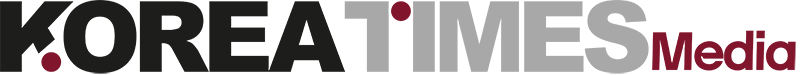400
눈 앞에 죽어가는 자식이 있는데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부모들이다.
자식이 차갑고 어두운 물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아무 것도 해준 게 없어 죽기 조차 죄스러운 이들이다.
피를 말리는 기다림 끝에 싸늘하게 주검으로 돌아온 자식을 놓고
‘축하한다’는 말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바다 속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유가족’이 되고 싶다고 통곡하는 이들이 있다.
믿기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초현실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처한 엄연한 현실이다.
“가슴이 있는 이에게 망각은 어렵다.”
지난 17일(금)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혹시나 하는 기대는 금물.
세월호 1주기를 두고 한 발언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 1년을 맞는 지난 16일(목),
콜롬비아를 방문한 대통령이
마누엘 산토스 칼데론 대통령과의 공식만찬에서 한 말이다.
6.25 전쟁 당시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5,000명 이상을 파병한
콜롬비아와의 혈맹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한다.
“가슴이 있는 이에게 망각은 어렵다.”
이 말은 콜롬비아 출신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명언이다.
마르케스는 1958년 쿠바 혁명을 지지했고
라틴 아메리카의 독재 정권과 이를 지지하는 미국에 반대한
콜롬비아의 대문호다.
그가 좌익 사회주의자에 가까웠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정치성향이 뚜렷한 그였지만
소설기법에서만큼은 그만큼 비정치적인 작가도 없었다.
초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경이롭게 펼쳐간 그의 글들은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움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정작 그가 최고의 이야기꾼일 수 있었던 건
그의 글에 실려있는 ‘살아있는 현실 감각’ 때문이다.
놀랍기 그지없는 그의 상상력들은
늘 현실세계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에게 현실과 괴리되거나 역사성이 결여된 글들은
생명을 잃은 거짓 언어일 뿐이었다.
마르케스가 평생동안 문학적 화두로 삼은 주제는 민중의 역사다.
19세기에만 8차례의 내전을 치르고
20만명에 달하는 민초들이 죽어간 콜롬비아 민중들의 아픔은
그가 망각할 수 없었던 ‘가슴’이었다.
민중의 처참한 역사가 망각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처절한 기억의 투쟁은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평생 추구한 문학적 가치관이다.
“가슴이 있는 이에게 망각은 어렵다.”
국가의 수장이 지구 반 바퀴를 날아가
낯선 남미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공권력은
애도와 분향을 하려던 유가족과 시민행렬을
차벽으로 진로를 막은 후 시위대로 만들었다.
그리곤 ‘물’에 빠진 자식들이 천국에 있다는 걸 확인한다 해도
살아가는 매일 매일이 지옥일 유가족을 향해
거센 ‘물’대포를 쏘아댔다.
지난 1년간 ‘눈물’이 마를 날 없었던 희생자 가족들에게
따갑고 매운 캡사이신이 잔뜩 든 ‘최루액’을 부어댔다.
서 있을 힘도 없는 분들을 힘으로 제압해
사지를 들어 경찰서로 연행했다.
이런 상황에 낯선 땅에서 들려온
“가슴이 있는 이에게 망각은 어렵다”는 대통령의 언어는
난해한 수학공식보다 더 어렵다.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어서 헛웃음이 날 지경이다.
정녕 모르는 것일까.
지금 대한민국은 ‘망각’은커녕
정상적인 ‘가슴’을 가지고서는
일분 일초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는 사실을.
광화문 한복판에 세워진
불통의 상징 차벽이 주는 위압감이 의미심장하다.
최윤주 편집국장 choi@koreatimestx.com